
한국 최초로 성공한 해외파 작가, 한국 제1세대 추상미술의 주요 화가,
“한국과 프랑스의 풍경과 전설이 서로 대화하도록 해준 동녘의 대사(大使)”(소설가 미셸 뷔토르)
이성자(1918~2009)에게 따르는 칭호들이다.
이성자 화백은 우리에게 <여성과 대지> 연작(1960~1968)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를 프랑스 화단에서 처음 인정받게 한 모국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땅을 깊이 가꾸듯 그렸다’는
두꺼운 질감의 추상화들이다. 이 연작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곤 한다.
남편의 외도로 파경을 맞고 프랑스로 떠나며 세 아들과 생이별한
이 화백이 깊은 그리움으로 붓질을 하며 그린 그림들이라고.
화백 이성자의 홀로서기
<여성과 대지> 연작을 직접 보면 분명 그리움의 서정도 있지만, 비애감보다는 땅을 경작하고 굽어보는 자의 넉넉함이 느껴졌다. 화폭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하나의 대지였다. 그가 목판화 기법을 응용해 물감을 찍은 부분은 밭이랑이며 촘촘하게 붓질한 부분은 작물을 가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이 경작한 거대한 땅이다. 대지만 모성인 것이 아니라 경작자도 여성으로, 거기에는 관습적인 여성성을 뛰어넘는 어떤 장엄한 기운이 있었다. 게다가 그 뒤에 이어지는 <도시>와 <음과 양> 연작(1972~1979)을 보면 더욱 큰 스케일에 호방한 기개가 넘친다. 예를 들어 <5월의 도시, 74>(1974)에서는 마치 거대한 태양 원반이 각진 요철로 쪼개진 듯한 두 개의 붉은 도형이 서로를 밀고 당기며 빛과 에너지의 진동을 일으킨다. 그것은 제목처럼 마천루에서 내려다본 기하학적 도시건축 풍경 같기도 했고, 세계를 형성하는 원리를 비전(秘傳)의 시각적 기호로 함축한 것 같기도 했다. 요철로 쪼개진 원판, 즉 음양(陰陽)의 기호는 이후 이 화백의 새로운 연작회화와 판화에도 지속적인 모티프로 등장한다. 이 화백의 말대로 음과 양, 동양과 서양, 자연과 기계의 합일을 추구하는 작품이고, 동아시아 여성인 자신이야말로 그 균형 잡힌 합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결국, ‘고국과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만으로 이성자의 작품세계를 말하기에는 그 작품세계가 너무 크고 넓었다. 이성자기념사업회를 이끄는 이 화백의 막내아들 신용극 유로통상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들과의 생이별에 이 화백 자신의 선택도 있었다고 한다. 남편은 그 시대 대부분의 여인이 그렇듯이 남편의 외도를 참고 가정을 지키기를 원했지만, 그는 홀연히 파리로 떠나버린 것이다. 이름 없이 ‘누구어머니’로 불리며 사는 대신, 홀로 서서 ‘이성자’라는 이름으로 삶을 산 것이다
타고난 재주와 절박함이 만난 결과
이 화백은 30대 중반에 불어도 잘하지 못하고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경험도 없는 상태로 미술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하는 일인 의상 디자인을 정식으로 배워 한국에서 의상실을 열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화가로서의 재능을 알아본 교수의 권유로 파리 그랑드 쇼미에르 아카데미에 입학해 회화를 공부하게 된 것이다. 좁은 다락방에 살며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불과 3년여 만에 성공적인 화단 데뷔를 하게 됐다. 신 회장의 말대로 “타고난 재주와 절박함이 만난 결과”였다. 그 후 이 화백은 <여성과 대지> 연작으로 프랑스 화단의 인정을 받고, 샤르팡티에같이 당대에 유명했던 갤러리에서 개인전도 하게 되었다. 또 1965년 서울에 와서 언론이 ‘금의환향’이라고 부른 성공적인 전시를 하며 이미 청년으로 성장한 아들들과 15년 만에 재회하기도 했다. 내심 어머니가 자신들을 떠났던 것에 미안해하길 바랐던 아들들은 당당한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예술가이자 벗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신 회장은 이야기했다. 한편 이 화백은 인기 많은 <여성과 대지> 연작에 안주할 만도 하건만, 1968년 노모(老母)를 여의면서 이제 ‘어머니’와 ‘땅’의 주제를 떠날 때라고 느꼈다. 그는 먼저 <여성과 대지>에서 발전시킨 상형문자 같은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을 진화시켰다. 그 진화는 1969년 뉴욕 마천루에서 경탄하며 내려다본 도시 야경과 결합하는 <중복> 연작(1969~1971)을 실험한 다음, 곧 형태와 색채에서 훨씬 단순하고 강렬한 <도시> 연작으로 이뤄냈다. 그림의 매체는 <여성과 대지>에서 쓰던 두텁고 부드러운 유화 물감에서 얇고 투명한 아크릴 물감으로 옮겨가게 된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는 결코 성공한 연작에 안주하는 법이 없었다. 5~10년마다 새로운 주제와 화풍, 재료로 새로운 연작을 실험하며 정진했다. 회화뿐만 아니라 목판화와 도예도 깊게 탐구했다. 노년기인 1992년에는 프랑스 남부 투레트에 많은 미술가들의 로망대로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스튜디오를 짓기도 했다. 그의 그림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음과 양의 모티프를 딴 두 동의 건물이다. 그곳에서 ‘양의 시간’인 낮에는 캔버스 위에 물감을 올리는 ‘양의 작업’ 회화를 하고, ‘음의 시간’인 밤에는 목판을 파는 ‘음의 작업’ 판화를 했다고 한다. 신 회장은 말했다. “어머니는 치열하게 작업하셨습니다. 한국에 오실 때는 도예 작업에 집중하셨죠. 한번은 프랑스에서 어머니와 위스키를 마시며 다른 많은 화가는 한 작품이 성공하면 계속 그 스타일로 밀고 나가던데 어머니는 왜 계속 바꾸시느냐고, 왜 편한 길을 택하지 않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머니가 답하셨죠. ‘편한 게 뭐냐. 예술가는 멈추면 안 된다. 내 그림이 50년 후, 100년 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면서 계속 새로운걸 실험해야 한다.’” 이 말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이 억해야 할 말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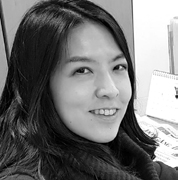
미술 작품을 비롯하여 영화, 웹툰 광고 등 모든 시각문화에서 이야기를 읽어내는 것을 좋아한다. 미술 기사를 주로 쓰며, 중앙 일보에 <문소영의 컬처스토리>, <분수대> 등의 칼럼을 연재했 다. 여러 매체에 글을 써왔고, 지은 책으로는 <명화독서>(2018), <그림 속 경제학>(2014), <명화의 재탄생>(2011), <미술관에서 숨은 신화 찾기>(2005)가 있다
작성일. 2019. 06. 26